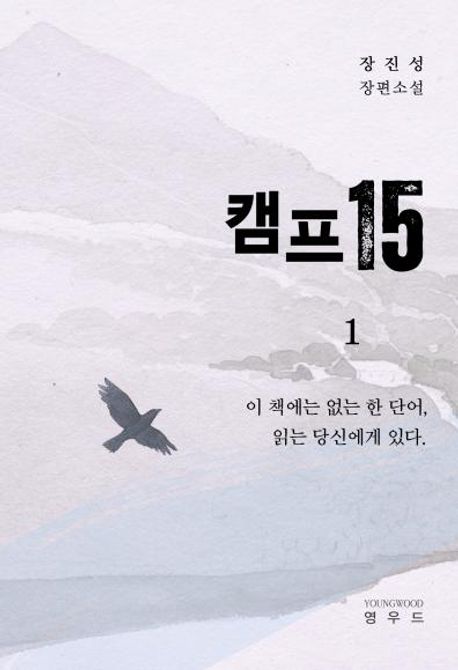-
아까 도성진의 '운명 명언'은 김동규 이야기로 넘어갔다. 성진이 얻어먹기만 한다고 불평스럽게 말했다. 성진의 말에 검은손이 선언했다.
"좋다. 오늘은 '약초 구걸 작전'이다."
그 말을 듣자 도련님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었다.
"그래도 이 도련님이 구걸하는 게 더 낫겠지요."
입은 도련님이 나선다고 해놓고, 실상은 입담 좋은 주둥이를 꾀어냈다. 바람도 마음을 품으면 길이 된다. 도련님은 약초보다 그 마음의 방향으로, 굳이 박해순이 있는 2분조 쪽을 향해 산 중턱까지 내려왔던 것이다.
"형, 할 수 있지?"
주둥이는 시선을 여자들 쪽에 묶어놓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 주둥이로 약초를 뱉어낼게"
뒤늦게 따라온 도성진이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여기서 뭐해요?"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다. 도련님이 급히 자기 입에 손가락을 세웠다.
"조용. 넌 왜 왔어?"
"내 할아버지잖아요."
도련님이 무릎을 털며 일어섰다.
"자, 출전하자."
주둥이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무대 등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냐."
잠시 후 '무대' 위로 먼저 도성진이 달려나갔다. 아이는 무작정 장찌엔의 등 뒤로 숨었다.
"살려주세요! 나를 때리려고 해요!"
뒤따라 달려온 주둥이와 도련님이 도성진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내가 캔 보약 다 처먹었지?"
"오늘 너 아침도 굶었는데 저녁까지 굶어 봐라!"
둘 다 소리만 컸지 힘은 주지 않았다. 여자들 바구니를 넘겨 보는 눈에 더 힘을 주고 있었다. 오히려 성진이 중간에서 양팔을 기껏 벌리며 정말로 찢겨나갈 것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장찌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쥐똥만 한 놈을 죽이자고? 엣다. 이거나 갖다 처먹어, 애 못 놔?"
그녀는 바구니를 통째로 집어 던졌다. 풀떼기가 와르르 쏟아졌다. 두 남자는 다 가진 통쾌함으로 바구니에 동시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한참을 뒤적이던 주둥이가 이게 통째로 던져준 이유냐고 따지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전부 잡초잖아?"
"잡초? 히야..."
짱찌엔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약초 같은 건 하나도 없네."
도련님도 바구니를 들춰보다가 아예 뒤집었다. 장찌엔의 등 뒤에서 도성진도 슬며시 목을 빼고 건너보았다.
"고사리 같은 것도 없어요?"
짱찌엔이 도성진을 돌아보며 두 손바닥에 침을 탁 탁 뱉었다.
"뭐야, 요놈은? 한패였어?"
주둥이는 그 틈에 민유정의 바구니까지 넘겨다봤다.
"혹시 그쪽은? 백복령이나 송이버섯, 산삼 같은 것도 없고?"
장찌엔이 자기 바구니를 다시 낚아채며 말했다.
"산삼 같은 거?. 히야 깜빡 속을 뻔했네. 어떻게 사기를 쳐도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고..."
민유정은 주둥이를 보자 유명인을 마주한 것처럼 눈이 반짝였다.
"어머, 맞죠? 자기비판서?"
주둥이와 도련님이 동시에 민유정을 바라보았다. 성진은 유정이 앞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맞아요. 소장이 건빵 준 그날, 저 아저씨. 주둥이!"
만나자고 작정하면 초면은 생략되고 구면부터 시작된다. 드디어 9분조 남자들과 2분조 여자들은 어색하게, 그러나 아주 낯익은 듯이 마주 앉았다. 주둥이가 코만 벌름거려도 민유정과 윤진경은 까르르 웃었다. 도련님만 좌불안석으로 계속 두리번거렸다. 옆에서 도성진이 슬그머니 도련님 귀에 입을 가져갔다.
“아저씨, 그 여자 찾죠? 가마치”
도련님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거칠게 숨소리를 내쉬었다. 그런데도 성진은 한 발 더 들어왔다.
"오늘 가마치 먹나요?"
도련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노려보며 잘근잘근 씹듯 말했다.
"안 먹는다."
그 눈빛에서 몽둥이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성진은 재빨리 주둥이 옆으로 달아났다. 만담꾼 앞에서 민유정은 눈도 입도 웃고 있었다.
"알아요? 만담 때? 내가 제일 박수 많이 쳤잖아요."
주둥이는 허세를 더 세우며 유정이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다.
"야, 그때. 정말 인상 깊었어."
"어떻게요?"
민유정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랄까… 보석처럼?"
주둥이는 갑자기 말을 더듬었다.
"아, 맞다. 내 이름은 박한석인데…"
민유정은 더 흥분해서 몸을 반쯤 일으켰다.
"어머나! 정말요? 그 박한석? 그 카세트 만담 박한석?"
"히야… 모르는 사람이 없구만. 이렇게 유명하니 여기다 집어 처넣었지."
"우와! 사회에 있을 땐요. 박한석 만담 카세트 들으며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장찌엔이 옆에서 더 놀랐다.
"카세트가 뭐야?"
도성진은 장찌엔보다 목소리가 더 컸다.
"카세트도 모른다구요? 원시인이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15호 원주민인데 원시인이지!"
도성진은 자기 미래를 보듯 눈이 퀭해졌다. 주둥이는 여전히 자기 흥에 겨웠다.
"세상 참 좁다. 그걸 돌린 입이나, 들은 귀나… 다 여기 들어왔으니. 바깥은 냄새 맡는 보위원 코만 남지 않았겠어?"
그 통쾌함에 주둥이와 민유정은 손바닥을 마주치며 웃었다. 그 웃음은 아주 잠깐 수용소 바깥세상을 되살리는 희미한 환기 같았다. 윤진경은 그 둘을 번갈아 보았다. 주둥이만 들썩이는 시간이 지겨웠는지 도련님이 슬쩍 장찌엔에게 말을 건넸다.
"여기 분조는… 사람이 적네? 이게… 다야?"
그러자 장찌엔이 갑자기 허파 깊숙이서 숨을 기껏 끌어올렸다. 두 손으로 배에 기합 주며 힘을 모으기까지 했다. 이상한 그 행동에 남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왜 저러나 싶었는데 장찌엔이 난데없이 폭발했다.
"2분조!! 이리 모엿!!"
그 고함은 숲을 가르고 하늘을 때렸다. 새들이 황급히 날갯짓했고 풀잎들도 움찔거렸다. 2분조 여자들은 매일 있는 일이라는 듯 무덤덤했다.
그러나 남자들은 전원 쓰러졌다. 도성진은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주둥이는 동공이 진동했다. 도련님은 풀밭에 벌러덩 넘어졌다가 솔잎 몇 개 붙은 상체를 일으켰다. 그리고 장찌엔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입은 다물고 있어도 눈이 확실히 말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여자냐…?"
하지만 그 격한 호출 때문인지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김상미와 박해순이 보였다. 그쪽을 누구보다 먼저 본 도련님의 입술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무리에서 몇 발자국 옆으로 옮겨가 자리를 넓게 잡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돌아 앉았다. 그런데 성진의 목소리가 터졌다.
"아저씨, 저기 그 이모 와요!"
도련님의 등이 움찔했다. 먼 산을 보며 볼이 씰룩거렸다. 박해순과 김상미는 주둥이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졌다. 김상미는 도성진을 향해 해쭉 웃었다. 박해순은 두리번거리다 혼자 떨어져 돌아앉은 도련님을 발견했다. 늘 저 모양인 그 등짝을 보자 입안이 부풀었다. 주변에 확 끼얹는 찬물처럼 내뱉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러고 있대요?"
그녀의 그 큰 목소리가 주변을 일순간 싸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도련님은 못 들은 척하며 허리를 멋있게 곧추세웠다. 그러면서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 오라니까… 만나준다니까…"
그런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주둥이의 입에서 또 뭔 짓이 터진 모양이었다.
한편 도성진과 김상미는 따로 만났다. 앞에서 걷던 상미가 돌아섰다.
"너, 그때 왜 나 도와줬어?"
상미가 웃으며 물었다. 성진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불쌍해서."
"그랬구나…"
순간 상미의 표정이 새침해지더니 이내 발끈했다.
"넌 안 불쌍한 줄 아니?"
"이게…"
도성진이 한발 다가서자,
"그래, 이게 뭐?"
김상미도 한 발 내디뎠다. 도성진은 몸을 틀어 주둥이 쪽으로 돌아갔다. 상미도 두 팔을 냅다 휘저으며 따라갔다. 그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던 도련님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저 쬐꼬만 것들도 만나는데…"
슬그머니 뒤돌아보니 박해순이 노려보고 있었다. 도련님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다시 돌렸다. 나뭇가지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중얼거리며 손에 힘을 주었다.
"오면, 진짜, 만나준다는데..."
박해순의 목소리가 다시 일어섰다.
"근데 저 사람은 혼자 지금 저기서 뭐해요?"
주둥이의 목소리가 편드는 건지, 갈라놓으려는 건지 크게 들렸다.
"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이거든. 지금 풀뿌리 연구 중이야. 뭐 꽂히면 저렇게 한 구멍만 판다니까."
그 말에 도련님의 손이 더 빨라졌다. 마음 같아선 당장 일어나 끼어들고 싶었지만 "한 구멍만 판다"는 칭찬이 발목을 붙잡았다.
다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이번엔 눈만 마주치면 진짜로 그 앞으로 가야겠다! 결심하며 도련님은 고개를 홱 돌렸다. 그러나 박해순은 이미 소장을 흉내 내는 주둥이의 성대모사에 정신이 푹 빠져 있었다. 민유정은 물론이고, 옆에 앉은 여자들까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주둥이의 그 꼴을 보며 도련님은 입꼬리를 씰룩였다.
"...오늘 저 주둥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음 편에 계속 …
'탈북작가' 장진성 소설 '캠프 15' 독점 연재 24
"저 쬐끄만 것들도 만나는데…"
입력 2026-01-08 16:27수정 2026-01-08 16:27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