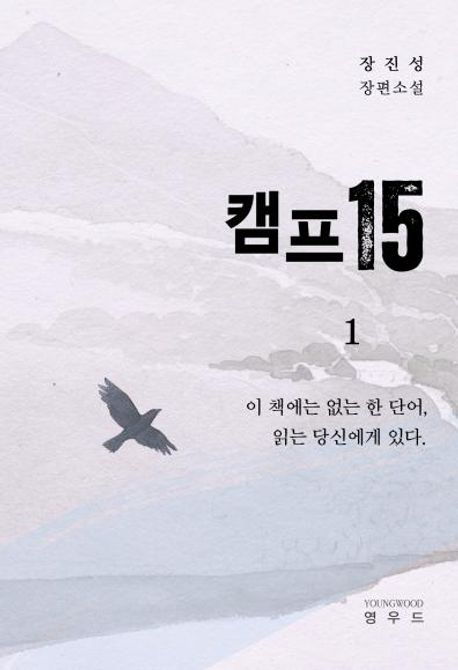-
오늘은 해발 500미터의 산에서 작업하는 날이다. 소장과 조직부장이 사전에 점검하고 경비대를 늘리라고 지시했던 그 부근이었다. 각 분조별로 산을 뒤져 다릅나무를 채취해 산밑으로 모으는 일이었다. 다릅나무는 습하고 바람 많은 비탈진 골짜기에서 특히 잘 자랐다. 줄기는 유난히 단단해 수분이 적어 마르면 금세 돌처럼 굳었다. 나이테가 촘촘하고 결이 곧으며 갈라짐이 적어 일본에서 수요가 많았다.
소장의 조카가 무역 실적을 위해 부탁하고 조직부장도 아는 혁명화 외화벌이 현장이었다. 작업량은 각 분조가 하루 5통씩 다듬어 담요에 싸서 메고 내려오는 것이다. 최종배는 수용자들을 산 위로 내몰며 밑에서 고함쳤다.
"너희들 목숨보다 귀한 나무야! 잘— 모셔와라."
그는 나무 일곱 통이면 상밥, 다섯 통이면 중밥, 그 아래면 하밥이라고 강조했다. 채찍 대신 '밥'을 쥐고 흔드는 그의 손에 수용자들은 다들 어이없어했다. 9분조는 산 중턱에서 멈춰 섰다. 남들이 잘 찾지 못하는 으슥한 바위 뒤였다. 검은손은 자리가 마음에 드는지 바위를 주먹으로 두드렸다.
"다들 앉자. 우린 어차피 하밥이야. 오늘 우리 작업량은 두 통. 배고픔도 아껴야 살 수 있어."
9분조는 검은손을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검은손은 둘러보다가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들었다.
"내가 너희들보다 여기 오래 살았잖아. 배고픔보다 무서운 게 뭔줄 알아? 생각이 비워지는 거야. 짐승이 되는 거야. 이 안에선… 사람이 돼야 살아."
주둥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난기가 많은 얼굴에도 그 말은 깊이 새겨들었다. 검은손은 룡평산 능선을 한참 바라보았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실루엣은 마치 말 없는 유령 같았다.
"월왕령… 마지막 본 게 뒷모습이었지. 그래서 그런가, 얼굴이 잘 생각 안 나더라. 그냥… 잘해줄걸. 그 생각만 계속 나."
말을 마친 그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빗질하듯 쓸어넘겼다.
"이 안에서 진짜 거울이 뭔지 알아?"
그의 음성은 그늘져 있었다.
"남의 얼굴이야. 죽음까지 들여다보는 거울… 월왕령은, 진짜 멋졌어."
그 말에 도성진의 눈빛에는 살짝 온기가 돌았다. 다른 분조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조원의 마음에 똑같은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그 침묵을 도련님이 먼저 깼다. 주둥이에게 돌아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형 얼굴 보면 말이야… 그냥, 주둥이밖에 안 보여."
짧은 웃음이 흘렀다. 허기진 배에 떨어지는 짭조름한 국물 한 모금 같았다. 도련님은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형, 내 관상 좀 봐줘. 이 도련님 상은 어때?"
주둥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한 번은 크게, 또 한 번은 천천히 반쯤 감았다. 턱을 돌려 목선까지 살핀 후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을 내렸다.
"암만 봐도… 가마치밖에 안 보인다."
모두가 웃음을 제대로 터트렸다. 그 소리에 등이 따가웠는지 도련님이 슬며시 검은손을 바라보았다.
"형… 나 이 별명 바꾸고 싶어. 도련님인데 현실은 거지잖아요. 그래서 더 화나."
검은손은 씁쓸하게 웃었다.
"여긴 말이지, 한 번 별명이 붙으면 그게 진짜 이름이 돼. 그리고 그 이름대로 얼굴도, 운명도 바뀌는 곳이야. 희한하지…?"
그는 말끝을 흐리며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 안에선… 진짜 자기가 누군지 잊게 돼. 사람들이 뭐라 부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대로 죽는 거고..."
그 말을 듣던 도성진의 입술이 불만으로 부풀었다.
"난 얼라반동이잖아요."
검은손이 들고 있던 막대기를 우지직— 소리 나게 꺾었다.
"넌 강해져야 살아. 별명이 장난 같아도 여기선 그게 운명의 줄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기억해.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스스로를 잊진 마라. 남이 만든 얼굴 속에 너를 잃으면… 그게 진짜 끝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 9분조는 조용해졌다. 검은손이 말한 생각, 얼굴, 거울, 그 모든 말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결론처럼 들렸다.
그랬다. 수용소라는 데는 운명은 물론, 타고난 얼굴도 바꾸는 곳이었다. 단지 바람에 마르고, 햇볕에 타고, 영양이 부족해 뺨이 꺼져서가 아니었다.
진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2년을 넘기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얼굴이 확연히 달라졌다. 악의를 품은 자는 눈매가 뾰족해지고, 소망을 품은 자는 눈동자가 허옇게 비워졌다. 우울한 자는 입꼬리가 무너져 내렸다.
얼굴은 더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표면이 아니었다. 그건 내면의 감정이 표류해 이식된 바깥의 살이었다. 살려는 자, 버티는 자, 무너진 자, 잊는 자… 그렇듯 각자의 내면이 자기만의 표정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이 지옥 속에서의 '생존의 가면'을 완성했다. 그 위에 낙인처럼 남들에 의해 찍히는 게 별명이었다.
이곳은 말하자면 거대한 태아였다. 살을 먹고, 시간을 삼키고, 생각과 표정을 소화한 뒤 기이한 얼굴로 재출산하는 지하의 자궁이었다. 도성진은 불쑥 일어섰다. 작은 주먹을 그늘 속에서 천천히 흔들었다.
"살자고 하면 내 손이고. 죽자고 하면 살인 도구지요. 내가 내 손을 믿는 게… 그게 운명이지요."
검은손을 비롯한 9분조 모두가 신기한 듯 서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일제히 "우와…" 막내를 쳐다보았다.
가족세대 2분조도 오늘은 독립 작업조였다. 그녀들이 찾고 있는 약초는 세신이었다. 험준한 고산지대에서만 나는 귀한 뿌리 약재였다. 기침. 코막힘, 오한, 두통, 염증성 기관지염에 특효다. 특히 뿌리엔 땀을 내고 통증을 덜어내는 기운이 응축돼 있었다. 일본에서는 향료와 전통 민간약의 원료로 쓰였다. 입욕제와 화장품 성분으로도 수요가 많았다. 소장의 외화벌이 품목에 포함된 전략 수출품이었다.
"그거 아니야. 잎 모양이 족두리처럼 생겼어. 줄기는 짧고, 뿌리는 가늘게… 이렇게 S자로 꼬여 있어야 해."
민유정이 하는 설명이었다. 자기 바구니에서 세신 뿌리를 꺼내 윤진경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이게 진짜야. 이 냄새… 코가 뚫릴 만큼 맵지?"
윤진경은 코를 가까이 가져갔다. 맵싸한 향이 콧속을 휘돌다 머릿속까지 맑게 치고 올라왔다.
"응. 진짜 뚫릴 것 같아."
윤진경은 눈을 깜빡이며 코끝을 문질렀다. 장찌엔은 호미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빙글빙글 돌리며 퍼질러 앉아 있었다.
"좋다야… 돌보다. 산에 오니 쌍놈들 보위원도 안 보이고..."
그런 2분조 여자들을 나무 뒤에서 훔쳐보는 두 남자가 있었다. 주둥이와 도련님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 …
'탈북작가' 장진성 소설 '캠프 15' 독점 연재 23
'배고픔'도 아껴야 산다
입력 2026-01-07 18:43수정 2026-01-07 18:43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