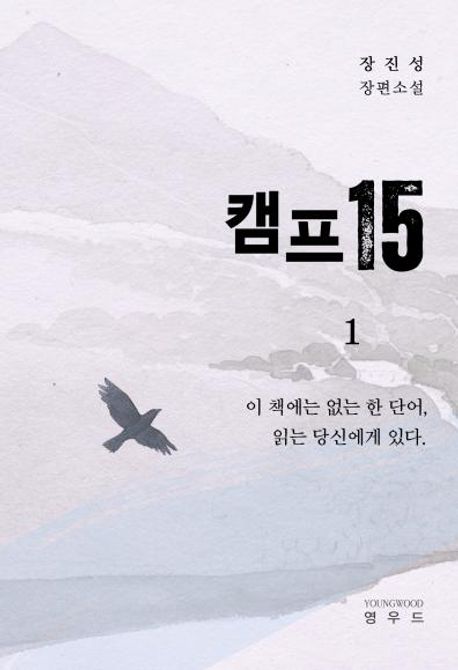-
기억
밤이었다. 독신자세대 막사 운동장 한끝에서 도성진이 쭈그려앉아 울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억눌렀던 숨결이 터져 나왔다. 손에 쥐고 있던 룡평의 장갑이 눈물에 젖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김동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성진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 손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만져본 온기였다. 성진의 손에는 다른 날보다 큼직한 옥수수가 들려 있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자갈을 밟듯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제 발로 용평 갈 정도면, 에이... 거기서도 잘 살 거야."
도성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거긴 2급이에요... 전과 달라요. 이젠 '장본인'으로 갔다구요. 영영 못 나와요."
김동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하늘로 가져갔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다.
"저 달을 봐라. 넌 여기 있고 룡평 형은 거기 있잖아? 머리 들면 같이 볼 수 있는 달이다."
성진은 김동규를 보다가 그 눈으로 하늘을 우러렀다. 김동규는 옛말을 들려주는 음성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거기 보위원들은 목숨이 하나지만, 룡평 사람들은 두 개야."
김동규의 눈이 작게 떨렸다.
"하나는 미리 땅에 묻어놓은 목숨, 나머지 하나는 그 배짱으로 살아가는 목숨."
성진은 옥수수를 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형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봤어요. 예심 받을 때 날 보고 미국 대사관에 들어갈 목적으로 강을 넘었다고 도장 찍으래요. 전 1년이나 버텼어요."
김동규의 목소리는 등까지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바로 그거라니까. 보위원들한테는 ‘총’이 있지. 우리한텐 그 '정신'이 무기야."
성진은 장갑으로 눈물을 마저 닦았다. 후- 하며 한숨도 내쉬었다. 김동규는 그의 손에 쥔 장갑을 바라보았다.
"이게… 그 애가 너에게 주고 간 거냐?"
"네."
도성진은 자랑하듯 장갑을 내밀었다. 김동규는 그걸 매만지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제 운명까지 다 주고 간 애구나..."
작게 말했는데도 성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운명이 뭐예요?"
김동규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운명... 네 손에 쥐어져 있는 거다. 봐봐."
그는 성진에게 돌아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살자고 하면 네 손이고, 죽자고 하면 살인 도구지. 네가 네 손을 믿는 게 운명이다."
"날 믿는 게 운명이라고요...?"
"월왕령, 그 애가 너한테 또 뭘 주고 갔는지… 이 할아버지가 그것도 말해줄까?"
도성진은 말없이 김동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작은 불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 불씨에 한 겹 심지를 더하듯 김동규는 힘주어 입을 열었다.
"나는 아버지 유골이 묻힌 곳으로 가지만… 너는, 기어이 살아나가서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
"땡! 땡! 땡!"
막사에서 울리는 금속성의 취침점검 종소리였다. 매일 듣던 그 소리인데 오늘은 성진의 마음에 전혀 다른 결로 울렸다.
새벽 4시. 그 시간이 되자 성진이 제일 먼저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은 짙었다. 막사의 공기는 눌려 있었다. 그 속에서 성진의 눈빛은 작고 확실하게 빛났다. 이 시간이면 수용자들 모두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악몽에 쫓기던 자도, 상처에 뒤척이던 자도, 배고픔에 침을 굴리던 자도, 모두 이 시각만큼은 마치 빈 자루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울분을 삼키며 잠든 자는 그대로 굳혔고, 모멸을 견디다 잠든 자는 눈물 자국마저 바짝 마른 채였다.
하루 내내 혁명화의 깃발처럼 바람에 펄럭이던 고통도 이 시간 만큼은 젖은 빨래처럼 무겁게 접혀 있었다. 이곳에서의 잠은 몸의 회복이라는 낭만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필사적인 휴식이라 부르기에도 과했다. 그건 단지, 기상과 취침 사이 체제가 허락한 잠깐의 면죄부. 깊은 잠이 아닌 말 그대로 기절의 연습이었다.
"후… 후… 후…"
막사 안에는 생존의 리듬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고르게 이어지는 코골이들의 합창이 리듬을 탔다. 그러나 그 속에서 유독 불협화음을 내는 하나의 소리가 있었다. 미꾸라지였다.
꿈에서도 그는 숨 가쁜 상황인 것 같았다. 남의 보따리를 훔치고 도망치다 잡혔는지 숨이 뚝 멎었다. 입은 반쯤 벌어졌고, 혀끝에는 숨이 걸려 있었다. 다시 후- 내쉬며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질주하는 것 같았다. 그 숨은 누군가가 장난으로 미꾸라지를 놓아주고, 다시 붙잡고, 또다시 끌려가며 지칠 때까지 무한 반복되는 것 같았다. 월왕령에게 맞은 왼쪽 볼은 간헐적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갈비뼈 언저리는 잘 때도 찌르는지 이따금씩 움찔거렸다.
"후우웁… 으흐읍… 아아아… 흐흐흐…"
잘 때도 초조한 그 얼굴 위로 담요가 덮쳤다. 담요는 그의 꿈속 보자기처럼 잽싸게 머리를 둘둘 말았다. 그 한 장만으로는 부족했던지 또 다른 담요가 따라 올라와 똑같이 감겼다. 수박처럼 부풀어진 그 머리 위로 시커먼 발들이 쏟아졌다.
쿵!
퍽!
질컥—!
담요는 비명도 꽉 막았다. 마구 밟던 발들은 나타날 때처럼 사라질 때도 순식간이었다. 담요 속에서 길을 잃은 미꾸라지는 허우적거렸다. 맞을 때처럼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방향을 모르고 허공을 긁었다.
그 모든 혼란을 제치고 간신히 담요를 벗겨냈을 때 그의 얼굴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였다. 머리카락은 태풍의 강도를 증명하고 있었다. 눈동자는 뽑혔다가 다시 박힌 것처럼 초점이 없었다. 이성도 반쯤 날아간 듯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다. 초점이 돌아오자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분명히 맞았다. 그런데 때린 놈들은 없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다들 자고 있었다. 잔다는데 깨워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꾸라지는 앞줄에서 잠자고 있는 9분조를 하나씩 살펴보았다.
검은손은 등을 보인 채 잠들어 있고, 주둥이는 팔짱 끼고 코를 고는 모습이었다. 도련님은 주둥이의 배 위에 다리를 걸치고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가수는 담요에 파묻혀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다. 유난히 눈에 띄는 금발은 자는데도 눈 뜬 것처럼 보였다.
제일 만만한 그 옆자리를 눈 빠지게 주시했다. 쪼그만 얼라반동은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자고 있었다. 모두가 우리는 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았다. 그게 더 억울했다. 화내기도, 따지기도,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이 기묘한 밤이 벌써 며칠 째란 말인가?
미꾸라지는 담요를 깨물며 울음처럼 터뜨렸다.
"…같이 살면서 왜들 그래요! 이게 며칠째냐구요!…"
"조용해, 개새끼야!"
지은 한숨과 내뱉은 하소연에 욕을 먹는 것도 서러운데 막사 안쪽에서 신발짝까지 날아왔다.※ 다음 편에 계속 …
'탈북작가' 장진성 소설 '캠프 15' 독점 연재 20
"살자고 하면 네 손이고, 죽자고 하면 살인 도구지"
입력 2025-12-30 14:59수정 2025-12-30 14:59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