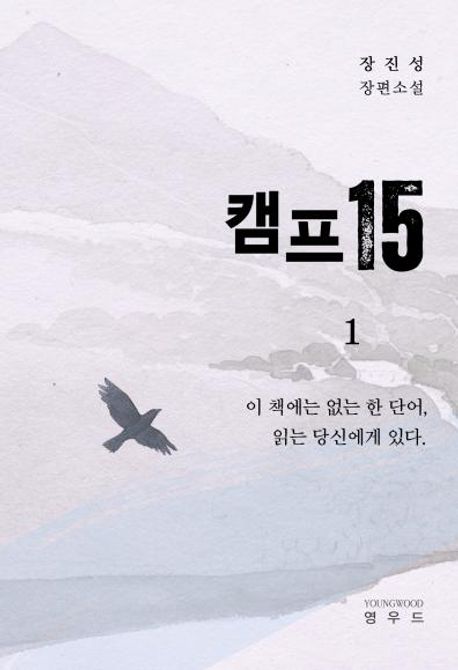-
같은 시간 운동장 한 귀퉁이 조명 아래에서는 미꾸라지와 월왕령이 마주 서 있었다. 빛은 약했고 그림자는 길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야… 백구인지 뭔지 그거 뺏기는 것보다 주먹밥 한 덩어리 내놓는 게 더 낫지 않냐?"
미꾸라지의 목소리는 그림자보다 더 얄밉게 늘어졌다. 허세도 아니고 겁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설득하려는 수작이었다. 그러나 월왕령의 눈빛은 단단했다.
"백구를 신고하면… 밤에 잘 때 아저씨를 죽일 거예요."
목소리는 작아도 예리한 단도 같았다. 미꾸라지는 오히려 웃었다.
"어이구나, 무서워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월왕령은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한텐… 9분조 아저씨들이 있어요. 내가 다치는 날에는 그분들이 아저씨를 짓뭉개 버릴 거예요. 이 말 하려고 나온 거예요. 다신 나한테 말 걸지 말아요."
월왕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어디선가 도성진이 달려왔다. 그는 보란 듯이 월왕령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었다. 둘은 한 몸처럼 딱 붙어 걸어갔다. 그 옆에서 성진은 일부러 콩콩 뛰며 걸었다. 팔을 공중에 높이 뻗치기도 했다. 흔드는 그 손엔 큼직한 옥수수 한 개가 쥐어져 있었다. 그걸 본 미꾸라지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눈빛은 끝내 식지 않았다.
아침 시간, 보위원 식당은 한적했다. 야간근무한 보위원 여섯이 줄지어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규율 속의 긴장처럼 그들의 식사는 조용했다. 숟가락 하나 드는 동작에도, 어깨도 일제히 각을 유지했다. 앉아서도 차렷 자세처럼 모두 허리를 곧추세우고 밥을 먹었다. 그때 식당 출입문이 열렸다. 소장이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군관 동무들 전체 일어섯!"
그중 한 군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소장 동지! 당직 군인들 야간 근무 마치고…"
"앉아, 앉아. 먹어."
소장은 손을 대충 내저으며 말을 잘랐다. 눈은 식당 안을 대수롭지 않게 훑었다. 그의 시선이 식탁을 닦고 있던 서련화에게 멎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다. 하지만 소장은 아무 표정 없이 자리에 가 앉았다.
"밥은 천천히. 물부터 줘."
소장은 서련화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했다. 서련화는 배식구 안으로 들어가 물컵 하나를 조심스럽게 쟁반에 얹었다. 그런데 아까 소장에게 경례하던 그 군관이 잽싸게 달려왔다. 서련화 손에서 쟁반을 빼앗아 들고 아첨까지 얹은 걸음으로 소장 앞으로 달려갔다. 소장은 컵을 내려다보다 눈길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군복 입은 놈이 왜 이런 걸 들고 다녀? 이게 네 일이야?"
소장은 컵을 들어 그대로 바닥에 물을 쏟아버렸다. 군관은 차렷 자세를 취하고는 몇 발자국 뒷걸음질 치다가 밥 먹던 테이블로 빠르게 이동했다. 잠시 후 소장 앞에 서련화가 물컵을 들고 다가왔다. 쟁반 위에서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옮겨놓으며 속삭였다.
"선생님, 물 갖고 왔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물 이상의 것을 주는 것 같았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등에 대고 소장이 느긋하게 또 한마디를 던졌다.
"물 한 잔 더 갖고 와."
서련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배식구로 향했다. 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슬며시 바라보았다. 곧이어 서련화가 다시 보일 때쯤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련화는 이번엔 쟁반 위에 아침 식사와 함께 물컵을 하나 더 얹어 왔다.
"선생님. 아침 식사, 여기에 물도 갖고 왔습니다."
소장은 대꾸 없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부터 떠보았다. 소장의 목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싱겁다. 소금 갖고 와!"
식사하던 군관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을 등 뒤로 의식한 소장은 엄하게 소리 질렀다.
"밥 다 먹었으면 빨리들 일어나서 일해!"
군관들은 허겁지겁 숟가락을 내려놓고 모자를 챙기며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서련화가 소금을 들고 돌아왔다.
"선생님, 소금 갖고 왔습니다."
그 뒤의 말은 아주 작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서련화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몸을 돌려 배식구로 향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또 한 번 목소리가 들렸다.
"국 하나 더 갖고 와!"
소장은 평소와 다르게 구내식당에서 식사 신간을 오래 잡았다. 날이 밝고 운전병이 찾아와서야 군용 지프 차에 올라탔다.
요덕의 하늘은 흐렸다. 짙은 구름이 산맥 위로 무겁게 깔려 있었다. 산 중턱으로 지프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대기하던 병사들 옆에는 군견들이 사납게 짖어댔다.
앞차에서 내린 소장의 군복 상의는 풀어 헤쳐져 있었다. 뚱뚱한 배가 꽉 조여 맨 혁대 밑으로 흘러 내려와 있었다. 두툼한 목에는 망원경이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다. 소장 얼굴에는 짜증이 얕게 깔려 있었다.
뒤차 문이 열리며 조직부장과 40대의 작전부장이 내렸다. 조직부장은 군화가 땅에 닿기 바쁘게 산 아래가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망원경을 들어 산 아래를 훑었다.
"작전부장 동무, 작업 지역 여기까지 개방해도 정말 큰 문제 없겠소?"
작전부장은 작전지도라도 펼쳐놓은 것처럼, 군인다운 말투로 지형을 읊기 시작했다.
"요덕은 산줄기 북대봉을 중심으로 사방이 둘러 막힌 분지입니다. 립석리, 구읍리, 대숙리, 평전리, 룡평리… 어디로 탈출하든 결국은 이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 15호 수용소는 다섯 개 리를 묶어 조성한 거대한 폐쇄구역이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요덕은 인민보안성 정치감찰국 산하의 작은 소규모 수용소에 불과했다. 주로 김일성의 단일권력 구축에 방해되는 권력층 간부들을 간첩이나 반혁명분자로 몰아 가두는 용도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이 후계권력을 장악하면서 당조직지도부 안에 국가보위부가 창설되었다. 그때부터 요덕은 다섯 개 리 규모로 급속히 확대됐다. 수령의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 확립을 명분으로 개인의 작은 말실수 하나, 행동 하나까지 반동으로 몰아붙였다. 개인의 생명권을 정치적 생명권과 연결시키는 전체주의가 강요되면서 1980년대 들어 수용 인원은 무려 5만 명을 넘겼다.
소장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대열부장이 준비하고 있던 라이터로 얼른 불을 받쳐 들었다. 소장은 한 모금 길게 빨았다. 연기를 뱉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주면 얌전히 앉아서 처먹기나 하지… 쯧쯧."
조직부장은 다른 쪽으로 망원경을 돌리며 다시 물었다.
"작년 장마 때 파괴됐던 전기 철조망. 함정이나 지뢰는 복구됐어?"
어조는 단호했다. 확인이 아니라 추궁처럼 들렸다.
숨을 고르던 작전부장은 소장과 눈빛을 나누고 힘주어 답했다.
"네. 빈틈없습니다. 모두 원상 복구했습니다."
소장은 조직부장의 등을 째려봤다. 담배 연기는 길게 흘렀다.
그 끝에서 조직부장이 망원경을 거두지 않자, 그가 보고 있는 그 지역을 소장이 직접 설명했다.
"립석강 하류는 물살이 세고 수심도 깊지? 아무튼, 룡평천 상류는 아예 턱도 없고… 아무튼 그쪽은 무력부 군단사령부 근처 아닌가?"
작전부장이 소장의 의도에 숫자로 채워 대답했다.
"네. 다섯 개리 전체가 깊은 강과 산으로 꽉 둘려 막혀 있습니다. 조직부장 동지 보시는 그쪽은 해발고 600미터인 우리 위치보다 훨씬 높은 1236미터의 강계산과 제비산입니다."
소장은 더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결기로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그리고 짧게 지시를 내렸다.
"내일 당장 경비 인원 늘리도록 해. 오늘 중으로 경비대 대대장에게 통보해."
작전부장과 대열부장이 간부들의 대화 자리를 피해 병사들 있는 쪽으로 이동했다. 산비탈을 내려다보며 소장은 손을 허리에 얹었다. 조직부장이 그 옆으로 다가왔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여기까지 작업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장은 먼저 주위를 둘러봤다. 병사들과 군견이 주변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다릅나무가 말이요… 아무튼 그게 해발 500미터에서 제일 잘 자란다더군."
조직부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소장의 말은 '경비'나 '노동력'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의중을 품고 있었다. 소장은 호기 차게 덧붙였다.
"내 조카 놈 하는 말이… 요덕은 그냥, 외화 돈덩어리라는 거요."
"그렇군요."
그 말에 조직부장도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둘은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무언가 빠르게 돌아가는 계산이 어렸다. 단순한 '보고서'로는 담을 수 없는 기회였다. 그들은 이제 철조망 너머를 감시나 통제가 아니라 투자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조직부장을 남겨두고 소장은 지프 차쪽으로 걸어갔다. 차 옆에 서 있던 대열부장이 소장 앞으로 급히 달려왔다. 그는 경례도 생략하고 소장 앞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가는 길에 작업 현장에 들려보자. 내가 가끔 나타나 줘야, 이놈들 정신 바짝 차리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열부장은 차 문을 열어주었다. 소장이 차에 올랐다. 그 순간 멀리서 천둥소리 한 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무지막지하고도 길게 뼛속까지 스며드는 울림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 …
'탈북작가' 장진성 소설 '캠프 15' 독점 연재 18
"내 조카 놈 하는 말이 … 요덕은 그냥, 외화 돈덩어리라는 거요"
입력 2025-12-22 11:51수정 2025-12-22 11:51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