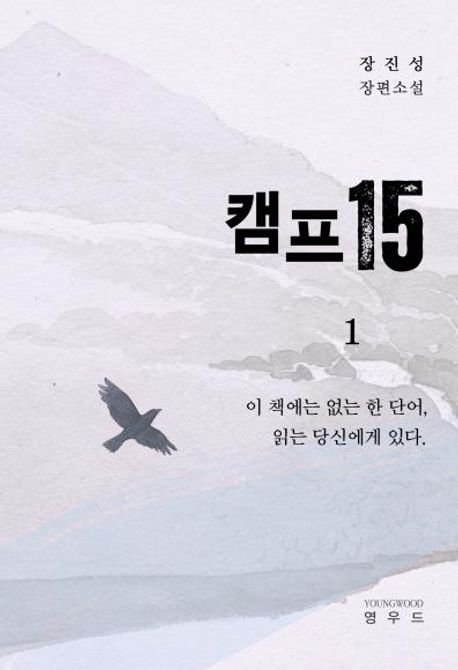-
오전 간부 조회 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관리소 정치부장 사무실로 불려온 이가 있었다. 상좌 계급의 후방부장이었다. 그는 15호 관리소 보위원과 죄수들의 식량과 물자 배급을 총책임지는 자였다. 정적을 가르는 소리는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림뿐이었다.
책상 앞에 선 후방부장은 뻣뻣하게 허리를 세우고 자꾸 책상 위 서류를 피해 눈을 돌렸다. 그 맞은편, 정치부장 최덕철은 얇은 서류철을 빠르게 넘기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짙은 주름이 고랑 타고 있었다.
"12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계산하면, 김동규 몫으로 남은 식량이 얼마나 되나?"
"하루 150그램이니 그래 봤자..."
후방부장은 계산하기도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정치부장은 속으로 날짜와 그램 수치까지 계산했다.
"그럼 김동규 앞으로 매끼 강냉이 하나씩 넣어주시오. 당장 오늘 점심부터."
후방부장은 반발 비슷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불법입니다. 정치부장 동지. 남은 배급은 국가에 반납하는 게 규정입니다."
정치부장은 서류에 시선을 둔 채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사망자, 처형된 자들의 배급은 어쨌나? 다 반납했나?"
그 질문은 후방부장의 정곡을 찔렀다. 그는 당장 집행하겠다며 급하게 방을 뛰어나갔다. 그 문이 닫히자 정치부장은 책상 위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 놓인 달력 위로 희미한 햇살이 번졌다. 12월 24일.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그 날짜는 총구멍처럼 보였다.
점심시간, 단독막사에서 김동규 부주석도 책상 위 달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역시 12월 24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옥수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동규는 그 옥수수를 내려다보았다. 두 눈엔 금세 물기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떨었다. 하지만 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내 얼굴을 천장으로 치켜들더니 소리 내어 웃었다.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모두 비껴간 웃음이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그런 웃음이었다.
그때 창밖으로 단독막사를 찾아오는 정치부장이 보였다. 김동규는 서둘러 바닥 한구석에 놓인 대야의 물로 세수를 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동규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에야 "누구요?" 라고 물었다.
문이 열리며 정치부장이 들어섰다. 그는 금방 세수를 마친 김동규를 보고 주춤했다. 방안은 적막했다. 책상 위에는 누가 보더라도 눈에 띄게 옥수수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정치부장은 김동규의 맞은편이 아니라 옥수수 앞에 앉는 느낌이 들었다.
"왜 안 드셨습니까?"
"혹시 살면서 말이오, 이 강냉이 하나에 알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 본 적 있소?"
김동규의 목소리는 밝았다. 정치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피했다.
"이걸 뜯어보니 450알에서 500알 사이가 되더구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동규는 옥수수를 바라보다가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이어갔다.
"내 시간들도 이렇게 틈틈이 세어봤다면 어땠을까 싶소.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나도 마음이 약해졌나 보오. 국가 부주석의 말년에 남은 게 이 강냉이 하나뿐이니 말이오. 하하."
그는 소리 내어 웃었다. 짧고 허전한 웃음이었다. 정치부장은 고개가 자꾸 밑으로 향해졌다. 차라리 서 있는 것이 가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았다.
"무슨 용건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었소?"
"본부에서...12월 24일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김동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쓰겁게 웃었다.
"이미 알고 있었소."
벽을 보던 정치부장의 시선이 김동규로 돌아왔다.
"날 가둔 그 사람들 심리를 내가 왜 모르겠소. 정량 식사 외에 이렇게 강냉이를 더 줄 때… 아, 이것도 정치부장이 배려해주는 거구나. 그것도..."
정치부장은 자기부터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날짜는 정해졌더라도 회고록이 우선이니,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김동규는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다.
"12월 24일이면 모든 게 완벽하오. 정치부장도 더 난처할 일이 없을 테고. 서로에게 좋은 날짜요."
정치부장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혹시 또 다른 부탁이 있다면 언제든…"
김동규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됐소. 바쁜데 어서 가보시오. 아무리 정치부장이라도 반동과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의심받는다니까."
그가 소리 내어 웃자, 정치부장도 의미 없는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나처럼 날짜가 정해진 사람들이 더 있을 거요. 그들도 한 번씩은 들러보시오. 각자 사연이야 다르더라도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얼마나 고맙겠소."
김동규의 말에 정치부장은 쓰고 있던 모자를 저절로 벗게 됐다. 그로부터 십 분쯤 지나 정치부장은 단독막사에서 나왔다. 그를 기다리던 30세의 운전병이 달려 나와 차 문을 열어주었다.
뒷좌석에 앉은 정치부장의 얼굴빛은 어둡고 굳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라던 김동규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펼쳤다. 수첩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는 이름들이 있었다.
『하반기 배급 종료 대상 명단』
그 아래로 이름과 소속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황진철, 구읍리 3작업반 3분조 7번-배급 종료: 9월 25일
김현옥, 대숙리 1작업반 1분조 4번-배급 종료: 10월 2일
박명순, 립석리 5작업반 2분조 2번–배급 종료: 10월 7일
최인철, 대숙리 4작업반 6분조 8번–배급 종료: 10월 11일
강인석, 구읍리 2작업반 4분조 5번–배급 종료: 10월 14일
정치부장은 잠시 그 이름들을 내려다보다 수첩을 탁 닫았다.
"주머니에 담배 얼마나 있어?"
운전병이 백미러로 그를 슬쩍 쳐다보며 대답했다.
"네? 한 갑 있습니다."
"있는 대로 다 줘봐. 일단 3작업반부터 가자."
"네, 알겠습니다."
운전병은 차 열쇠를 돌려 시동을 켰다.
소장은 보위원식당에서 괜히 심술을 부리며 먼저 나왔다. 쟁반을 나르는 여자 수용자 중 한 명이 어릴 때 자기를 괴롭혔던 옆집 아줌마처럼 생겼다는 생트집이었다. 질긴 닭고기가 쟁반을 나르는 여자들처럼 늙었다며 불평도 길게 쏟았다.
동석했던 대열부장과 조직부장도 수저를 놓고 쫓아 나왔다. 소장이 그들을 이끌고 향한 곳은 강둑 작업장이었다. 작업장엔 수용자들로 넘쳐 있었다. 소장은 여자 독신자세대가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렸다. 여자 보위원 하나가 잽싸게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소장 동지, 여자독신자 3중대는..."
"됐어, 됐어."
소장은 손을 휘휘 저으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서련화가 있는 줄을 슬쩍 확인했다. 우연을 가장하며 그 앞에서 발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서련화를 비롯한 여자독신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소장은 여전히 산을 바라보며 푸념을 흘렸다.
"이 작업이 빨리 끝나야 산에 들어가지... 아무튼, 본부는 우리 실정도 모르고 전화질만 해대니... 나와 보라고 할 수도 없고... 들어가면 절벽이고..."
그 한탄이 길어질수록 조직부장의 시선은 젊은 여자들을 훑었다. 눈길이 서련화에 고정됐다. 그는 그녀의 얼굴 여기저기를 천천히 뜯어보았다. 가볍지도 노골적이지도 않았지만 보는 눈길이 길었다. 소장은 그제야 여자 수용자들이 눈에 들어온 것처럼 혀를 찼다.
"얼굴들은 반반한데, 죄짓고 들어와서 말이야. 쯧쯧."
소장의 말에 조직부장은 좀 더 깊은 눈으로 서련화를 들여다 봤다.
"그 고운 손으로 쟁반이나 들고 다니면 모를까. 돌이 뭐야, 돌이? 쯧쯧."
소장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조직부장은 아직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한 발짝 뒤처져 서련화를 다시 돌아봤다.
"대열부장."
"네."
"식당, 젊은 애들로 바꿔. 소장 동지 밥맛도 없다는데… 아까 저 애는 어때?"
“누구 말입니까?”
"저기, 저 키 큰 애. 쟤."
"아, 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꿔."
소장은 슬그머니 돌아섰다. 조직부장의 등 뒤에서 한쪽 눈을 감고 그가 가리키는 손끝을 슬며시 따라가며 확인했다. 이어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조직부장 동무도… 어지간히 밥맛이 없긴 없었던 거구만."
간부들이 흔들흔들 작업장을 빠져나가자, "점심시간!"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다음 편에 계속 …
'탈북작가' 장진성 소설 '캠프 15' 독점 연재 14
12월 24일 …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그 날짜는 총구멍처럼 보였다
입력 2025-12-15 09:46수정 2025-12-15 09:46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