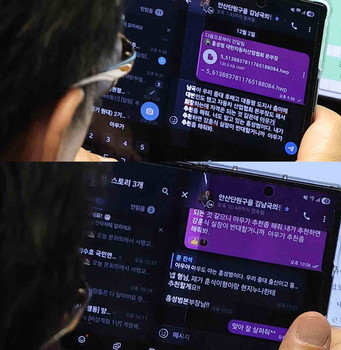-

- ▲ 부영 사옥. ⓒ뉴데일리DB
기업이 특정이슈로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 틀린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채찍이 약이 된다. 특히 기업이 상습적, 고의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강력한 제재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대표적인 예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인천 송도와 경남 창원(진해), 서울 금천 등 전국 곳곳에 오염토를 방치해 지역사회로부터 날선 비난을 받고 있다.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사들인 부지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자 정화작업을 차일피일 미룬채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부영이 배짱을 부리는 배경엔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현행법은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염토 방치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면 처벌 강도가 '새발의 피' 수준이다.실제 부영은 2018년부터 7년간 인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정화명령을 4차례나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벌금은 고작 1000만원에 그쳤다. 이중근 회장으로서는 최소 1000억원대에 이르는 정화비용을 벌금 1000만원으로 퉁친 셈이다.불행중 다행인 부분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염토 방치행위를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미 올해에만 소위 '부영방지법'으로 불리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가장 최근인 지난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기업이 정해진 기간내 이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부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 2월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오염토 방치 기업을 가중처벌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다만 단순히 법안 발의에만 그쳐선 안된다. 특히나 부영의 오염토 방치행위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인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오염토 발견부지는 이미 지역사회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노른자 땅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땅주인인 부영은 요지부동이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다.인근 지역주민들도 오염토 부지가 본인과 가족 건강에 직·간접적 악영향을 주는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더욱이 장기간 방치된 부지는 주변 슬럼화를 야기해 부동산시장을 가라앉히는 요인이 된다.정치권은 국회에 계류중인 부영방지법을 속히 통과시켜 무책임한 오염토 방치행위를 멈춰야 한다. 나아가 국정감사에서 해당사안을 공론화해 기업의 무책임 경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바로 서고, 지역사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취재수첩] 오염토 상습방치 '부영방지법'
- 박정환 기자
입력 2025-09-24 10:28수정 2025-09-24 10:32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박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