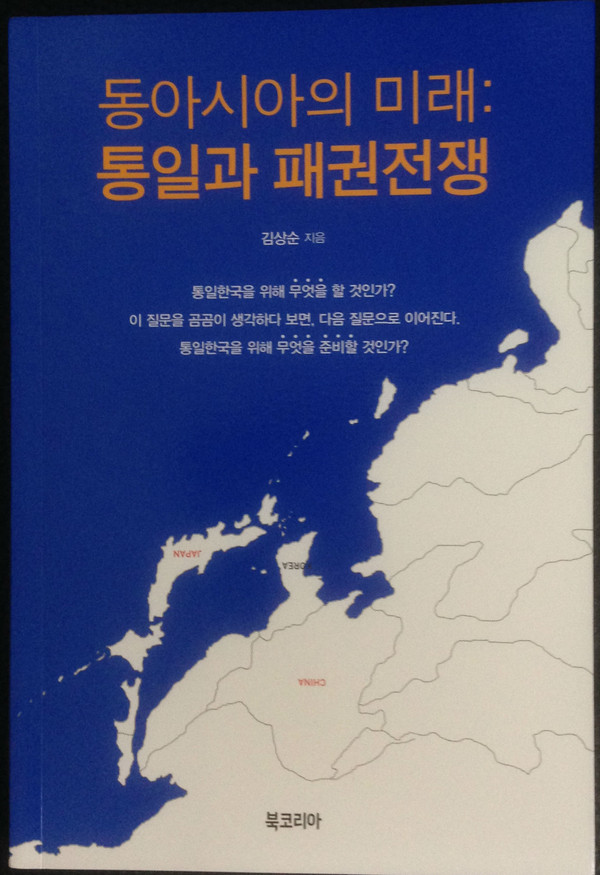-
자강(自强)의 외침이 넓게 울려 퍼지길...요즘 들어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격랑의 동북아” 등등의 말을 많이 듣고 따라한다.
하지만 이 말들은 어제도 그 어제도 나온 말들이고, 내일도 더 내일에도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될 것이다. 이 말들에 동의 한다면, 한 나라의 생존을 위한 번영, 번영을 위한 생존의 과정에서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중함을 지울 수가 없다.지난 7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과 일본에 앞서 대한민국을 찾았다고 당시 언론과 국제정치 학자들은 호들갑(?)을 떨고 떨었다. 이에 대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하는 시 주석의 행보에 취해 있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가 급박하고 심각하다.”고 모 일간지의 북경(北京) 특파원은 언급하기도 했다.이렇듯 자칭 타칭 현자(賢者)들이 최근 세계 및 동북아와 그 속의 대한민국을 논한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하지만 이들의 말과 글 저변에는 대체로 “낀 나라”의 한스러움과 콤플렉스가 짙게 배어있다. 오죽하면 어떤 이는 “강대국은 하고 싶은 걸 하고, 비(非)강대국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까지 말했겠는가.김상순이라는 몇 살 아래의 동지를 우연히 만났다.
먼저 한중관계와 관련한 그럭저럭 괜찮은(?) 그의 글을 읽었고,
얼마 지나서 직접 만났을 때는 얼굴에 수염을 기른 예사롭지 않은 모습(지금은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다닌다)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가 갖고 있는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열정과 신념은
늦깎이 학자라기보다는 열혈 청년운동가에 가깝다는 느낌이었다.“통일은 미래의 불확실한 한민족 공동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이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의미의 정당성을 충분히 가지긴 하나, 통일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통일의 실체에 정확히 꿰뚫은 탁견(卓見)이며, 그 속성을 적확(的確)하게 집어냈다.그가 풀어낸 한중관계의 오늘과 내일, 머지않아 닥칠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여러 나라간의 이러 저러한 다툼과 악수(握手)들에 관한 글들을 읽노라면, 먼저 ‘쉽다’는 단어가 떠오른다. 어렵지 않게 다가오고, 현장(現場)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이 책은 실천서(實踐書)가 아니다. 대부분이 현상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통하는 가장 큰 울림은 바로 자강(自强)이다.
따라서 담론(談論)의 핵심, 즉 자강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독자-특히 대한민국 독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책을 통한 저자와 독자의 소통(疏通)이라고 생각한다.“외교는 ‘협상(協商)전쟁’이고, 국익(國益)이 일관된 ‘최우선 목표’이다.”,
“시대의 흐름을 타고, 국민의 ‘민의(民意)’를 반영하라.” 등등의 다소 교과서적(敎科書的)인
저자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고, 프랑스 화가 조르주 비고(Geores Ferdinand Bigot)의 한반도 ‘낚시질’이란 만화가 왠지 께름칙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작금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반증(反證)일 것이다.물론 아무런 감정 없이 어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뒷머리를 한방 맞은 것 같은 묵직함이 짓누르거나,
문득 문득 기분 나쁜 소름 돋는 이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것도 단번에 말이다.
그러면 적지 않은 나이의 김상순이란 중국 유학생(留學生)이 던지는 더욱 교과서적인 말이
날카롭게 가슴 후비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근대사에서 한반도가 대국관계에서 소외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국 간의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 아직도 겪고 있는 분단의 쓰라린 과오와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동북아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펼쳐야 한다.”이덕기 (사)충호안보연합 연구소장
화제의 신간 동아시아의 미래: 통일과 패권전쟁 김상순 지음
[책] 시진핑의 패권에 한국 통일의 길을 묻다
- 이덕기
입력 2014-11-05 12:18수정 2014-11-05 12:28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이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