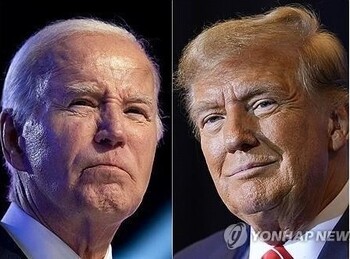'자진 월북' 몰아가며 물타기 골몰… 아들의 절규에 남의 말 하듯 "나도 마음 아프다"軍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해 北이 빨리 사과했단다… ‘삶은 소대가리’가 감격할 지경
-
李 竹 / 時事論評家“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 키에 68kg 밖에 되지 않은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 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이 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녘 군인들에 의해 총살·소각 당했다는 그의 아들이 썼다는 편지 한통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라는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음에도 그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글재주가 스스로 부끄럽지만...저간의 여러 사정·사연들이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기에 중뿔나게 이리저리 나열·평가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두렵기도 서글프기도, 한편으로는 헛웃음마저 감추기 힘든 몇몇 일들이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그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짓거리의 최고 책임자를 향해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 운운하거나, 그 무슨 “계몽군주”(啓蒙君主)를 짖어댄다. 더군다나 그 공무원의 “자진(自進) 월북(越北)”을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하여 매도(罵倒)하고 책임을 물타기하려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계몽군주’라... 그리 받들어 모시고 싶은 작자들과 족속(族屬)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나라 ‘국민’들에게는 이 땅 전부를 손아귀에 쥐겠다고 ‘개꿈이나 꾸는 돼지새끼’가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름하여 ‘개·몽(夢)·돼·지’라고 밖에는 달리 부를 수가 없다. 글쎄 ‘개몽돼지’가 너무 심하다면, 격(格)도 있다고 하니 ‘견몽돈엄’(犬夢豚嚴)이라고 해줄까. 아무튼...그 ‘개몽돼지’ 품에 안기기 위해 그 먼 바다를 애써 헤엄쳐갔을 거라고?여러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른바 ‘자진 월북’은 결코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저토록 절절한 사연과 치밀하고 한(恨)이 잔뜩 서린 의문을 표현할 수 있는, 총명하고 사리분별(事理分別)이 명확한 아들을 버려둔 채 아버지가, 이 나라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그럴 수가 있을까? 인지상정(人之常情)이란 말을 떠올려보라!북녘에서 부랴부랴 내려 보냈다는 ‘통지문’... 진정성이라고는 한 개의 ‘쌀눈’[米眼]만큼도 안 되는 “미안(未安)하게 생각한다”에 감읍(感泣)하고 환호(歡呼)한 무리가 있다. “전화위복”(轉禍爲福), “남북관계 개선 계기” 등등 ‘죽은 자’는 안중(眼中)에도 없는 흰소리를 떠들어 댔다. 그러다가...저 아들의 피 눈물 섞인 절규에는 고작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였다. 이에 한 술 더 떠서 “월북한 니 아버지 때문에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라고 들이대는 강아지보다 못한 작자들도 떼 지어 나타났다고 한다.이렇게 이 나라 ‘국민’을 잃어버렸다. 단지 숫자상으로 ‘한 목숨’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는...“총살(銃殺) 후, 시신(屍身) 소각(燒却)”이라고 발표했으면서도, “연유(燃油) 부어 태워라”는 지시를 감청(監聽)했다면서도 북녘의 이른바 ‘통지문’에 휘둘려 사라진 시신(屍身)을 찾겠다고 서해 바다를 뒤지고 있단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북녘의 ‘개몽돼지’ 똘마니들이 나팔수를 통해 짖어댔다고 했다. “영해 침범” 운운하는 기준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이 아니다. 지난 1999년 저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넘지 말라며 떼를 쓰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 ‘경비계선’은 서해 NLL 훨씬 이남(以南)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해경과 해군이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 수색 작업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8㎞[5마일]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10월] 3일 확인됐다. 우리 측의 정당한 수색 작업을 ‘영해 침범’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NLL 무력화를 시도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기사 토막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북녘의 서해 NLL 무실화(無實化)에 장단을 맞춘 격이라니... ‘바다 영토’를 슬그머니 내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의심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사정이 이러할진대...“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른 시간 안에 사과 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판단한다...”‘문의(文意)의 전당’에 걸맞게 국정감사장에서 ‘그 당’ 의원 나으리가 짖으셨단다. ‘삶은 소대가리’가 감격에 겨워 훌쩍거릴 지경이다. 하긴 아무개 조간신문의 지적성 기사를 보노라면, 그나마 ‘국민의 군대’는 나은 편이라고 해야 하나. 기사 제목만 옮긴다.“강경화 안 부르고, 이인영 1시간 지각, 文 대통령 보이지 않고... 공무원 피살 직후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그래서 말인데...이미 쉬어 터진 “이건 나라냐?”는 이제 그만 갖다 쓰기로 하자. 하도 여러 군데 쓰이니 식상(食傷) 그 자체 아닌가. 대신에 젊잖게 옛 싯귀를 들려주면 어떨까?북녘의 ‘개몽돼지’를 추종·숭배·흠모하면서, 이 나라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그 무슨 ‘대화’(對話)와 ‘조공’(朝貢)의 불쏘시개쯤으로나 써먹으려는 무리에게 아주 적합할 듯하다. 이 나라 ‘국민’들의 어쩌지 못하는 폭발 직전의 울분을 담아내기에도 그렇고...그 옛날 ‘삿갓어른’이 읊었다고 전해 온단다.“천탈관이득점[天脫冠而得點 하늘 천(天)자가 갓(冠)을 벗고, 점(點)을 얻었다]하고,내실장이횡대[乃失杖而橫帶 어찌 내(乃)자가 지팡이(杖)를 잃고, 띠(帶)를 그었다]라.”그리고... 동네 강아지들아 “미안하고 고맙다!”<이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