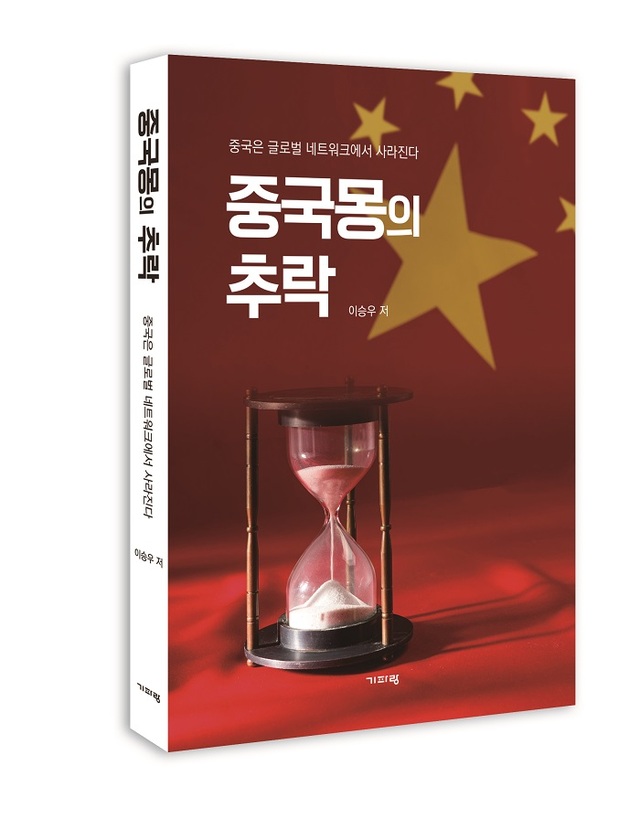이승우 '중국몽의 추락'… '중국몽'은 시진핑의 일장춘몽,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이유 밝혀
-
2017년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학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국가"라며 "'중국몽(中國夢)'과 함께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면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적 언사'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추(錘)가 기운 발언이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등 굴종적인 '3불(不)'을 약속했다.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고 공언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 패권국(G1)으로 등극한다는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합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최근 국제 상황을 보면 중국몽 실현의 한 축인 '일대일로'는 기존 강대국들의 '경계'와 '견제'를 부르는 자충수가 된 듯한 모습이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치는 수많은 나라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핵심인데, 최근 참여국들에 대한 중국의 '갑질'로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아 중국 편에 서려던 중진국·신흥국·개발도상국들이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성장 둔화, 통계보다 더 위태한 외환 보유고, 부동산 버블 붕괴 등, 중국 경제의 내부 위기 조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중국몽'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그렇다면 스스로 '주변 봉우리'를 자처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금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구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경제 침체 속 '내부 모순'도 누적… 주변국들 등 돌려"
국내·국제 정치와 외교 안보에 정통한 저자는 단호히 "중국의 굴기(崛起)는 주변국들은 물론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격화되는 미·중 충돌 와중에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서야 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에서 20여년 동안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미국 특파원까지 지낸 저자는 최근 발간한 '중국몽의 추락(도서출판 기파랑)'이라는 책에서 "미중 충돌과 중국·홍콩 내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한국에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굴러온 기회를 걷어차고 위기를 자초하는 악수(惡手)를 두고 있다"며 "한국의 외교 현실이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향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만주족(청)을 등지고 망해 가는 명나라를 편든 결과가 정묘·병자호란이었고, 근대화를 거부하고 청·일·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결과가 망국이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정세 속에서 번번이 '오판'으로 위기를 자초해 왔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중국몽이 이루어질 수 없는 헛꿈이고, 바로 그 꿈으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빚으로 쌓아올린' 만리장성에 더 이상 기대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 온 식량과 에너지에 주목한다. "못 먹이면 민심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체제를 위협할 불씨로 농촌 출신 도시 빈민인 '농민공(農民工)'과 '퇴역 군인 집단'을 거론한다.
중국은 이미 1976년과 1989년 두 차례에 걸친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내부 모순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2020년 '송환법'과 '보안법'으로 한층 격화된 홍콩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겪고 있다.
거세지는 인권·민주화 요구를 더 이상 힘으로는 찍어누를 수 없기 때문에 '공산 중국'의 붕괴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중국의 다민족 구성도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소다. 신장(위구르족), 티베트, 네이멍구(몽골족), 닝샤(후이족), 광시(좡족)의 5대 자치구를 비롯해 55개 소수 민족을 거느린 중국이다. 인구 비율로는 미미하지만 지역으로는 중국 영토의 절반, 게다가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고 안보 가치도 높은 이들 지역의 자치와 분리독립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중국 정권이 이에 대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모든 위기의 근저에, 공산당의 부패와 계파 갈등이 있다. 지진·수해·팬데믹 등 모든 재해의 뿌리에 인재(人災)가 있고, 정치·행정·사회 등 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한 지 오래. 결정적으로, 공산당 내 권력 분점 전통을 어기고 헌법을 고쳐 가며 '시 황제'를 꿈꾸는 시진핑의 1인 장기 집권 야욕은 자연스럽게 당내 갈등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는 상태다.
역사에 '영원한 독재 권력'이 없었듯, 시진핑의 허점을 노리는 정적(政敵)들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패권국 미국의 '중국 죽이기'‥ 트럼프 독단 아냐"
특히 돋보이는 분석은 중국이 미국의 보복으로 인해 과거 소련 해체와 일본(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되리라는 것이다. 애당초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맺고 중국을 세계 자유무역 질서로 안내한 것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함이었고, 그 중국이 미국에 칼끝을 겨누자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죽이기에 나섰다.
일본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초 기지로서 미국의 비호 아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나 미국에 위협이 되기 시작하자 환율 카드로 버블 경제를 야기했고, 그 버블이 붕괴한 결과가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장기 침체다.
중국에 적대적인 미국의 정책은 '이단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돌출발언, 기껏해야 공화당 강경파의 한때의 화풀이일 것이라는 순진한 전망에도 저자는 일침을 놓는다.
'트럼프가 무엇을 했다'는 식의 기사나 분석은 대중의 흥미는 끌 수 있어도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미국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 행정부는 주요 대외 정책을 결정하기 전 오랜 연구와 세밀한 정세 분석을 진행한 뒤에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고, 특단의 사태가 없는 한 중장기 계획을 한 치 어긋남 없이 이행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감정적으로 밉고 싫어져서 '반중국'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 저자 소개
이승우 : 1999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정치부, 산업부, 스포츠부, 영문경제뉴스부 등을 거쳤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현재 문화부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듀크 대학교 아시아안보 연구과정을 객원연구원으로 이수했다.
언론계 생활 대부분을 국회, 정당, 청와대, 정부 부처를 출입하며 국내·국제 정치와 외교 안보, 남북 관계, 행정, 통상 분야 등을 취재하며 보냈다. 내세울 것 없는 경력이지만, 가장 왼쪽부터 가장 오른쪽까지 다양한 이념을 표방하는 정파들을 모두 장기간 밀착 취재한 거의 유일한 현역 기자라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다. 기자가 한 분야를 이해하려면 최소 10년 세월이 걸리고 '균형 감각'까지 갖추려면 최소한 20년 경험은 쌓여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