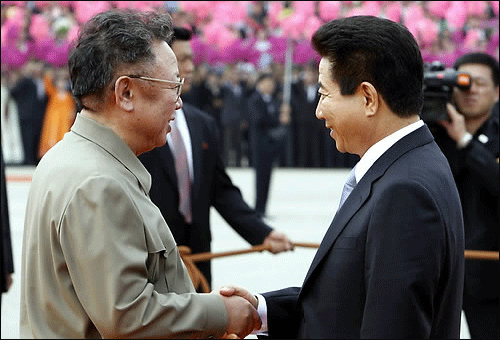-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밀기록의 한 단계 위인 ‘지정기록물’을 만들어 누구도 확인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검색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해선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기록은 물론 어떤 정상회담 관련 기록도 검색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2000년 6월15일 청와대 비서실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환영행사’ 14쪽 문건을 포함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은 39건이 검색됐다.
이 외에 김대중 정부의 기록으론 김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 관련 문서 190건이 공개돼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도 1995년 3월 6일 독일 헬무트 콜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 문건(43쪽)을 포함해 143건의 정상회담 기록이 나타났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정상회담 기록물만 없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공개 대상인 비밀기록물이나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만 검색할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 기록물은 상당수가 지정기록물”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런 관리 규정을 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제정됐다.
2007년 4월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가기록원이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때 비밀취급 인가자가 열람할 수 있는 비밀기록의 한 단계 위에 ‘지정기록물’이란 게 생겼다.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 외엔 누구도 최장 30년의 보호기간 중 열람할 수 없는 기록물을 뜻한다. 지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이 법률 17조 ‘지정기록물 보호’ 조항엔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기록도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보호기간 내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헌법 개정과 같은 절차를 밟게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록원에 총 825만여 건의 대통령 기록을 남겼는데 이 중 34만 건이 지정기록물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기록물들은 ‘○○○○년 대통령 기록’ 등의 제목과 보호 기간이 부착된 채 상자에 봉인돼 있다. 보호 기간은 10년, 15년, 30년 등이다. 보호기간은 퇴임한 다음 날인 2008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이들이 어떤 문서인지는 국가기록원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기록은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盧, 비밀기록 한 단계 위 ‘지정기록물’을 만들어
盧 대통령 시절의 정상회담 기록물만 없다!
- 오창균 기자
입력 2012-10-19 10:45수정 2012-10-22 20:58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다른 대통령들의 기록물은 남아 있는데··· 굳이 비밀 ‘지정기록물’ 만든 까닭은?
관련기사
오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