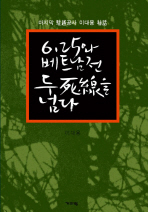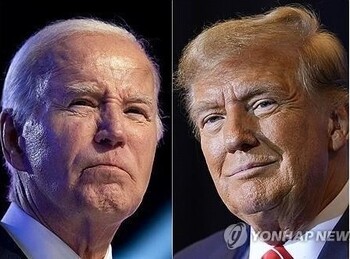-
남북대화 문제들을 들고 나와 나를 그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밀어 넣으려고 시도했으나 헛일이었다. 선임요원은 손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그것을 손에 들고 혼잣말로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 우봉리 142번지, 지금은 살기 좋은 과수원으로 변했지”하고 중얼거렸다.
누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 부터 그들이 내 고향을 알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렸으나, 그 사실은 이제 아주 분명해졌다. 그들이 그것으로 나를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심경에 추호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묵비권 행사로 일관된 제2차 신문을 끝내고 나는 격리된 감방으로 되돌아와서 하룻밤을 보냈다.
9월 30일 아침 일찍, 나는 제3차 신문을 받기 위해 또 꽁리가 189번지 2층으로 호송되었다.
“어젯밤 잘 쉬셨소?” 선임요원이 신문조로 인사를 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누님들 소식을 알려주겠소.” 여러 번 해온 말을 또 되풀이 했다.
“당신이 베트남 인민 5백 명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있소. 안했다면 대답 좀 해보오." 터무니 없는 날조된 공갈이었다.
“그렇지. 틀림없군. 대답을 못하는군.” 북한 선임요원은 혼잣말로 지껄였다. 흰 셔츠 입은 자가 남북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또 꺼냈으나, 나는 상대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는 내가 꽤 밉다는 듯이 선임요원은 나를 한참 응시했다.“당신 뭘 믿고 그러는 거요. 유엔을 믿소? 유엔 사무총장이 당신 같은 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줄 아오?”
그는 “흥”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더욱 언성을 높였다.
“박정희를 믿고 그러는 거요? 어림도 없소. 박정희는 당신을 위해 단돈 1전 한 푼도 못 내겠다는 거요. 당신이 남반부로 돌아갈 줄 아오? 베트남은 쌀이 남아서 당신을 먹여주는 줄로 아오? 베트남 속담에 과일을 따먹을 때는 그 나무를 심은 사람부터 생각하라는 말이 있소. 전범들이 사형당한 사실을 당신은 모르고 있소?”그 다음에는 흰 셔츠 입은 자가 남북회담이니 통일이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떠들어댔다. 내가 귀를 막으면 그들은 이야기를 멈추곤 했다. 선임 요원은 남반부의 부정부패·정치혼란 등을 한참 이야기하고,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는 곧 적화통일이 될 거라고 단정했다. 북한정보공작선임요원이 언성을 높였다.
“사태는 이렇소. 당신은 이 사태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오. 기회를 놓치면 망하는 법이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중요한 결심을 할 때요. 나중엔 후회해도 소용 없소. 조국통일이 된 다음에 영광을 누릴 것이냐, 또는 제2차 대전 후 전범들이나 티유 일당처럼 아주 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달려 있소.”
엷은 초록색 아오자이에 흰 바지를 속에 입은 20세 남짓의 베트남 여자가 베트남 주스와 얼음이 담긴 세 개의 유리컵을 책상위에 놓고 갔다. 선임요원은 회유책으로 호주머니에서 담배까지 꺼내어 내가 있는 방향으로 밀어놓으며, 주스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라고 했다. 나는 머리를 무겁게 옆으로 흔들고 침묵으로 이를 묵살해 버렸다. 북한정보공작선임요원은 기분 나쁜 듯 표정이 굳어지더니 주스를 몇 모금 꿀꺽꿀꺽 마시고나서 언성을 다시 높여 말했다.
“당신 누님이 당신 신병인도를 국제적십자사에 요구한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오. 당신이 평양에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오. 당신은 망명 성명서를 써야하오. 북반부에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안 쓸 수 있소? 당신이 안 쓰면 우리가 당신 망명 성명서를 만들어 신문기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되는 거요. 당신 냉면 좋아하오? 좋아하면 평양에서 먹읍시다.”
나는 그자를 노려보았다. 그자는 잠시 말 문을 닫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 아이들은 몇이나 되오. 보고 싶소?”북한요원들은 번갈아가며 한 이야기를 되풀이 반복하면서 공갈·협박·회유를 계속했다.
그렇지만 내 입을 열지는 못한 채 점심때가 되어 제3차 신문이 끝났고, 나는 감방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 나는 다시 불려갔다.
“낮잠을 좀 잤소? 아마 못 잤겠지. 수면제가 필요하면 좀 주겠소. 필요하오?”
나를 희롱하는 북한선임요원의 공갈 발언에 이어 흰 셔츠 입은 자가 전에 한 이야기들을 재탕해가면서 이런저런 신문을 했으나, 나는 이에 휘말리지 않고 의연히 앉아 있었다. 선임요원이 손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보면서 말했다.“당신이 1964년, 여기 대사관 무관으로 왔소? 무관시절에 꽤 우쭐 댔겠시다!”
“당신이 티유로부터 보국훈장을 받았소? 티유와 친한 사이라는데 왜 티유가 도망갈 때 함께 안 갔소?”
“학훈단장이 뭐요? 그거나 말해보시오. 2군 참모도 했소? 당신이 육사 7기요?”
그는 호통 치듯이 소리 질러 말하더니 서류를 다시 손가방 속에 챙겨 넣었다. 나는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한참 만에 손을 떼었더니 그자가 “당신처럼 서툰 배우는 처음 봤소. 뭘 귀를 막고......”하는 것이었다.해가 서쪽 지평선으로 기울어질 무렵, 선임요원이“당신은 북반부에서 도망친 도주범이오. 사회주의 형제국간에는 범인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소. 우리가 당신을 북반부에 못 데리고 갈 줄 알아? 얼마든지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소” 하고는 대한민국의 부패상을 또 늘어 놓았다.
나는 참다못해 “여보시오. 그런 소리 백 번, 천 번, 만 번 아니 백만 번 해보시오. 나에게는 다 소용없는 말들이오. 내가 눈 하나 까딱할 줄 아시오? 어림도 없소”라고 했다. 제4차 신문도 그들에게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차속에서 나는 광대뼈 보좌관에게“나를 북한으로 강제 납치해 가려는 모양인데 나는 죽어도 북한에는 안가겠소. 베트남 측은 이것을 알아야 하오”했더니, 그가“당신의 고향이 북조선이고, 친척들도 북조선에 있으니까 가야하지 않소?”하고 물었다. 가재와 게는 한통속이었다.
이날 저녁, 나를 감방으로 호송하던 경비원 리엔은 형무소 간수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영어로“안닝노이찡 깐보(장교나 간부) 말에 의하면 제2단계 신문을 받기 위해 한국외교관 세명은 빠르면 10월 25일, 늦어도 11월 25일 까지는 하노이로 북송될 것이고, 하노이에서도 북조선 깐보가 또 신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하고 말해주었다.
너무 늦게 감방에 돌아온 관계로 저녁밥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찬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후, 가슴의 아픔을 가시게 하기 위해 정좌를 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눈을 감았다. 누님도 자식도 삶도 죽음도 없는 무아의 경지 속에 시간은 흘러갔다. 취침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정좌를 풀고 땀을 닦았다. 고요한 정적 속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변소 옆 두개의 물독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식기를 달그락 거리던 생쥐 한 마리가 후다닥 도망치다가 잘못해서 물이 반쯤 차 있는 독 안에 빠졌다. 생쥐는 물 속에서 허우적 거렸지만 탈출의 가망은 전무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뱀과 쥐와 파리지만, 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 빗자루를 들고 사지에 빠진 생쥐를 건져 살려 보냈다.
10월 1일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또 불려가서 제5차 신문이 시작되었다.
“당신 누님은 고무신 이야기를 하면서 웁디다. 당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소. 북반부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도 한 번 가봐야 하지 않겠소?”
“당신은 북반부에서 잘 살고 있는 동생과 제수를 왜 남반부로 데리고 갔소? 그냥 뒀으면 좋을 텐데. 괜히 그래가지고 제수는 지금 인천에서 그게 뭐요?”
“당신 새장가 들 마음은 없소? 북반부에 가면 새장가들 젊고 예쁜 색시가 있소. 환갑이 되면 큰 상을 차려 줄거요. 잘 생각해 보시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소.”북한정보공작선임요원은 말을 멈추고 가끔 뜸을 들여가며 신문을 이어나갔다. 그 사이사이 흰 셔츠 입은 자가 끼어들어 회유발언을 했다. 나는 이따금 귀를 막기도 하면서 침묵으로 저항했다. 밖을 내다보니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 있고 망고나무 사이를 참새들이 자유로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당신 누님 소식을 좀 전하겠소. 조카 하나는 농장관리인이고, 또 하나는 트럭(트랙터인지 분명치 않았음)을 운전하고 있소.”
북한선임요원은 말을 한 후, 나를 응시했다.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갑갑한데 시(詩)나 한번 읊어볼까”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손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들고 읊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이 흘렀어. 잘 있었어? 탁용이도 잘 있구?”
시가 아니었다. 분명히 편지였다. 탁용이란 서울에 살고 있는 내 동생의 이름이다. 북한 선임요원은 누님 편지의 서두를 읽은 것이다. 그들은 내가 자의에 의한 망명성명서를 쓰게 하려고 한 말을 재탕, 삼탕 되풀이하면서 공갈·협박·회유를 일삼았으나 나는 초지일관 꿋꿋하게 버텨 나갔다. 제5차 신문도 이렇게 진전 없이 끝나버렸다.10월 2일 아침 제6차 신문이 있었다.
북한 선임요원은 저주스러운 눈길로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다가“당신이 여기서는 말을 않고 있지만 어디 두 고봅시다. 다른 곳에 가서는 우리에게 말을 안 하고 못 배길거요”라고 했다. 북월 하노이 같은 곳으로 북송 이감시켜 고문 하겠다는 공갈이었다. 나는 코 웃음을 치며 “흥!”하고 씩 웃어버렸다.
서리 맞은 잡초들은 단숨에 시들어가지만, 소나무는 서리 맞고 눈보라쳐도 웅장하게 버텨나간다. 이 세상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도 있는 것이다. 제6차 신문에서 그들은 자기들 머릿 속에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나를 강제로 전향시켜 평양으로 데리고 갈 구실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으나 헛수고로 끝나버렸다. 오후 0시 반경에 나는 감방으로 돌아왔으나, 오후 2시에 다시 끌려가서 제7차 신문을 받았다. 내용은 제6차 신문의 연속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초연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꽤 시간이 흐른 뒤, 흰 셔츠 입은 자가“왜 저렇게 외곬일까? 우리말을 왜 모두 적의(敵意)로만 받아들일까?”하고 체념하듯 말했다.
북한 선임요원은 나의 귀에 면역이 되어 버린 이야기들을 또 떠들어댔다. 나는 딴 생각을 하며 그자의 이야기에 정신을 쏟지 않았다. 그자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알겠소?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하시오”했다.나는 그자가 말한 세 가지를 귀담아 듣지 않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저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자는 큰소리로 “좋소. 묵비는 중립이오. 중립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소. 여태 우리가 말한 것을 당신이 모두 시인했으며 당신이 북반부 고향에도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끝내겠소. 가시오!”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었다. 한마디 해야 했다.
“여보시오. 어째서 묵비가 시인이오? 나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말한 것을 하나도 시인하지 않았고, 또 죽어도 북한 땅에는 안가겠소!”하고는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7차에 걸친 그들의 신문은 일단 모두 끝났다. 다만 제2단계 신문을 위해 하노이로 북송될 것이라는 문제가 미결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
<6.25와 베트남전 두 死線을 넘다>
[도서 출판 기파랑]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동 1-49 동숭빌딩 301호
전화 : 02-763-8996 (편집부)
홈페이지 : http://www.guiparang.com/
E-mail : info@guiparang.com
(41) "냉면 좋아하오? 평양서 먹읍시다"
- 이대용
입력 2010-08-11 09:32수정 2010-08-11 10:57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이대용